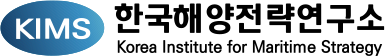KIMS Periscope 제291호
독일의 인도-태평양 지침 : 독일의 인도-태평양 외교정책의 원천 및 결과
단일 강대국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이 수립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은 중국만이 미국의 패권에 심각한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강대국 간의 경쟁은 점점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 2010년대 초부터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강국은 중국의 부상을 걱정스레 주시해왔다. 유럽의 강국 또한 그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새로운 현실에 맞춰 조정하도록 더욱 더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독일에게 도전적인 일이다. 미국은 독일 안보의 보증인이자 독일이 수혜를 입어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보증인이 되어왔다. 미국은 또한 독일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반면, 독일과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향유하고 있고, 중국은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독일과 중국의 관계는 지난 몇 년 사이 악화되었다.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묘사하는 가운데, 독일은 중국 이외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강국을 향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시켰고, 거의 20년만에 처음으로 태평양 수역에 전함을 파견했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독일의 활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독일의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에 관한 간략한 역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독일의 주둔은 지극히 새로운 현상이다. 냉전 기간 중 서독의 외교 정책은 소련이 가하는 상시적인 위협감 및 유럽 통합을 증진시키기 위한 독일의 노력으로 인해 유럽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독일은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제 친구와 동맹국에 둘러싸여 유럽 내 어느 국가로부터도 위협을 받지 않고, 여전히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보호를 누리면서 독일은 비유럽 파트너와의 관계를 다각화하려는 의지가 생겼다. 1990년대에는 주로 경제적인 관계였으나, 이후 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독일은 비유럽 지역 강국과의 정치적 관계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아시아에 대한 독일의 전략에서는 중국이 특별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양국은 “국제적 책임에서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이는 2014년 3월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의 수준으로 상향되었다. 해당 합의서에서의 협력이 의미하는 바는 폭넓게 정의되었지만, 실제로는 주로 경제적인 협력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경제적인 협력에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 또한 있었다. Guido Westerwelle 외교 장관과 같은 독일 정치인은 중국의 성장 번영과 서구와의 경제통합이 중국을 더욱 자유주의적인 국가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을 통한 변화”라고 불리는 이 전략은 수 년간 독일 의사결정자의 생각을 이끌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은 더욱 부유해질수록 더욱 자기주장이 강해졌고, 저자세 정책을 내려놓았으며,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독일이 주된 수혜자였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독일은 앞으로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숙고는 영향력 있는 독일산업연맹 (Federation of German Industries, BDI)이 2019년에 발행한 글에서 드러났는데, 이 글에서 중국은 “파트너”이자 “제도적인 경쟁자”로 기술된다 – 지난 30년간 중국의 성장으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은 독일의 산업계였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놀라운 묘사였다. 사실, 한때 중국과 독일을 가까이 지낼 수 있게 한 것은 경제적 이해였지만, 양국의 경제는 예전만큼 상호보완적이지 않게 되었다 – 실제로,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독일은 중국의 지경학적 제안 (가령, 일대일로와 같은)에 대한 의문을 품었고, 중국 기업을 독일 기업의 라이벌로 보기 시작했다. 독일은 자국이 외국 공급업자에게 얼마나 의존적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중국의 통신 장비 제조업자를 점점 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는 양국간 늘어가는 경제적 차이에 대한 몇 가지 예시에 불과하다. 그와 동시에, 지정학적 차이가 생겨났다. 2020년 독일 연방의회 외교위원회 (Bundestag Foreign Affairs Committee) 의장인 Norbert Röttgen은 홍콩, 대만, 남중국해 등 독일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시각 차이를 가리키며, 중국이 ‘독일 최대의 외교정책 도전과제’라고 언급했다. 2010년대말 무렵, 독일의 외교 엘리트는 중국을 중요한 파트너이자 경쟁자, 그리고 제도적 라이벌로 간주했다.
인도-태평양 비전
2020년 독일은 인도-태평양 지침을 발행했다. 독일 정치인과 외교관이 수 차례 표명했듯이, 이 지침은 독일이 인도-태평양 지역 강국과의 관계를 다각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독일은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을 너머 역내 다른 국가와의 파트너십 또한 발전시키고 싶어한다. 인도-태평양 지침에 나타나듯이, “이 지역이 21세기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데 핵심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은 “독일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독일 외무장관 하이코 마스 (Heiko Maas)가 표현한 바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으며, 전 세계 GDP의 거의 40%가 이 지역에서 산출된다; 독일 정부는 향후 독일이 이 지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독일의 비전은 다음의 영역을 포함한다: 평화와 안보, 역내 국가와의 관계 다각화 및 심화, 해상 교통로 (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 확보, 개방되고 자유로운 무역, 디지털 변환 및 연결성, 기후 보호, 그리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대한 접근 등의 확보.
연성균형 (Soft balancing)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의 사용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인도-태평양 지침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이 발행물은 이 지역, 그리고 중국을 향한 새로운 독일 정책의 한 부분에 불과하며, 독일은 “연성균형”으로 알려진 전략을 점점 더 채택하고 있다.
2020년 및 2021년 독일 외무장관 하이코 마스와 국방장관 Annegret Kramp-Karrenbauer는 전례 없는 빈도로 호주, 일본, 대한민국 및 싱가포르의 장관을 만나 해상 교통로의 자유, 지역 영토 분쟁, 사이버 및 IT 협력, 그리고 무기와 같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두 독일 장관은 독일이 해당 국가와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2021년 8월 독일은 이 지역에 소형 구축함 바이에른 (Bayern)을 파견했다. 이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독일 전함이 태평양 지역을 방문한 것이었다. 이 전함의 존재로 인해 역내 세력 균형에 변화가 오지는 않았다. 이는 역내 독일의 민주주의 파트너의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진 상징적인 제스처였다. 이러한 제스처는 또한 독일이 외교와 협상을 너머 이 지역에 대한 외교정책의 도구에 군사적 수단도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Annegret Kramp-Karrenbauer의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이에른의 임무는 이 지역의 미국, 영국, 호주 또는 프랑스 해군의 임무와 차이가 있다: 소형 구축함이 모든 분쟁 수역을 의도적으로 피함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다. 더욱이, 중국이 독일 전함의 입항을 거절하자 상하이 항구에 대한 계획된 방문을 취소해야 했다. 중국 당국은 지역 내 어떠한 형태든 독일의 군사적 주둔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다.
결론
독일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에 대한 ‘무역을 통한 변화’ 정책의 실패에 근간하고 있다. 독일 내에서 중국의 부상은 갈수록 독일의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 강국과의 협력을 통해 독일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원칙뿐만 아니라 역내 정치 및 영토의 현상을 옹호하려 하고 있다. 그 목표는 세계에서 새로운 양극 구조를 피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독일은 중국을 향해 연성균형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했다. 물론, 군사적 취약성과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는 점, 그리고 중국과의 대단한 지리적 거리를 고려하면, 독일은 중국을 억제할 책임을 기꺼이 미국과 역내 강국 연합체에 전가하고자 할 것이다.
Germany’s Indo-Pacific guidelines: Sources and consequences of Germany’s Indo-Pacific foreign policy
The ‘unipolar moment’ is over and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created by the United States after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is being challenged by Russia and China. However, since the US authorities believe only China is capable of posing a serious challenge to American hegemony, competition among the great powers is increasingly shifting to the Indo-Pacific region. Since the beginning of the second decade of the 21st century, the United States and Indo-Pacific regional powers have been anxiously observing the rise of China. European powers, as well, face growing pressure to tailor their Indo-Pacific strategies to the new reality.
The US-China conflict is a challenge for Germany. The United States has been the guarantor of German security, and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at Germany has benefited from. The United States is also Germany’s biggest export market. On the other hand, Germany and China enjoy a strategic partnership, and China is Germany’s biggest trade partner.
Over the last few years, relations between Germany and China have deteriorated. With China being described by chancellor Angela Merkel as a both a “strategic partner” and a “strategic competitor”, Germany intensified its diplomatic efforts towards Indo-Pacific regional powers other than China, and for the first time in almost two decades sent a warship into Pacific waters. How should Germany’s current activit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be understood?
A brief history of Germany’s engagement in the Indo-Pacific
Germany’s presence in the Indo-Pacific region is quite a new phenomenon. During the Cold War, the foreign polic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as concentrated in Europe due to the permanent sense of threat posed by the Soviet Union and Germany’s engagement in furthering European Integration. But afterwards, Germany saw new opportunities opening up. Now surrounded by friends and allies, without any state in Europe threatening it, and still safe under the US security umbrella, Germany became willing to diversify its relations with non-European partners. In the 1990s those relations were mainly economic, but later, as the strategic importance of Asia grew, Germany also began developing political relations with non-European regional powers.
In Germany’s strategy towards Asia, China has a special role. In 2004 the two countries signed an agreement on a ”strategic partnership in global responsibility”, which was raised in March 2014 to the level of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hough the cooperation the agreement concerned was defined broadly, in practice it was mainly economic, though that economic cooperation was also intended to serve political goals. German politicians such as foreign minister Guido Westerwelle argued that China’s growing prosperity and economic integration with the West should turn it into a more liberal country. This strategy, called “change through trade”, guided the thinking of German decision-makers for years. Yet, against expectations, as China became richer it also became more assertive, gave up its low-profile policy and started questioning the principles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at order, of which Germany was a chief beneficiary, began to wobble – and Germany began rethinking the future of its relations with China. The first reflection of this was a paper published by the influential Federation of German Industries (BDI) in 2019, where China was identified as both a “partner” and a “systemic competitor” – a rather surprising description, since it was German industry that had profited enormously from Chinese growth in the previous three decades. The truth was, though economic interests had once brought China and Germany closer together, their economies had become less complementary – in fact, they had begun to compete against each other. Starting in the mid-2010s, Germany became sceptical about Chinese geoeconomic proposals (like the BRI), and saw Chinese companies as rivals of German companies. Chines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producers were seen with growing suspicion as Germany realised just how dependent it was on foreign suppliers. These are only a few examples of the growing economic diverg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At the same time, geopolitical differences arose. In 2020, Norbert Röttgen, the chairman of the Bundestag Foreign Affairs Committee, pointed to the following geopolitical differences between Germany and China: Hong Kong, Taiwan, and the South China Sea, and called China ‘the biggest foreign policy challenge for Germany’. By the end of the second decade of the 21st century, Germany’s foreign policy elites saw China as – simultaneously – an important partner, a competitor, and a systemic rival.
An Indo-Pacific vision
In 2020, Germany published its Indo-Pacific Guidelines. As indicated numerous times by German politicians and diplomats, the guidelines were designed to diversify Germany’s relations with regional powers in the Indo-Pacific region. Germany wants to maintain good relations with China, but also to go beyond them by developing partnership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The Indo-Pacific has been described by German foreign minister Heiko Maas as “a priority of German foreign policy”, since the “region is becoming the key to shaping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twenty-first century”, as indicated in the Guidelines. Half the world’s people live in the Indo-Pacific, and almost 40 per cent of global GDP is created there; the German government anticipates that Germany will be economically dependent on the region in the future. Germany’s vision of the Indo-Pacific region therefore includes the following areas: peace and security, diversifying and deepening relations with countries of the region, securing 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 securing open and free trade, digital transformation and connectivity, climate protection, and access to fact-based information.
Soft balancing
Germany’s Guidelines were published despite Chinese opposition to the use of the term “Indo-Pacific”. But the publication is only one pillar of the new German policy towards the region – and towards China, against which Germany is increasingly engaging in a strategy known as “soft balancing”.
In 2020 and 2021, German foreign minister Heiko Maas and defence minister Annegret Kramp-Karrenbauer met with unprecedented frequency with their counterparts from Australia, Japan, South Korea and Singapore to discuss subjects such as freedom of SLOCs, regional territorial disputes, cyber and IT cooperation, and arms. All along the way, the German ministers underlined the interests and values Germany shares with those countries.
On top of that, in August 2021 Germany sent the frigate Bayern to the region. This was the first visit by a German warship to the Pacific since 2002. The presence of the ship certainly didn’t change the balance of power in the region. It was a symbolic gesture intended to strengthen the position of Germany’s democratic partners in the region. It also backed up the words of Annegret Kramp-Karrenbauer that Germany is ready to go beyond diplomacy and negotiations and to also include military means in its arsenal of foreign policy tools in the region. But the mission of the Bayern differs from those of the American, British, Australian or French navies in the region: it did not demonstrate freedom of navigation, since the frigate deliberately avoided all disputed waters. Moreover, its planned visit to the harbour of Shanghai had to be called off when China refused to allow the German ship to enter port. The Chinese authorities found it difficult to accept any sort of German military presence in the region.
Conclusions
The Indo-Pacific strategy of the German government is rooted in the failure of its ‘change through trade’ policy towards China. The rise of China is increasingly interpreted in Germany as a threat to German interests. Today, through cooperation with Indo-Pacific regional powers, Germany seeks to support not only the principles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but also the regional political and territorial status quo. The goal is to avoid a new bipolar structure in the world. For this reason, Germany developed a new strategy towards China: soft balancing. Of course, given its military weakness and reluctance to participate in military operations, as well as its great geographical distance from China, Germany is more than happy to pass the buck of containing China to a coali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regional powers.
- 약력
Rafal Ulatowski는 바르샤바대학교 (University of Warsaw) 정치 및 국제학부 (Faculty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 조교수이다. 그는 아데나워재단 (Konrad Adenauer Foundation), 독일 학술교류처 (German Academic Exchange Service, DAAD, 2013년 및 2014-2015년) 독일 폴란드 문화 연구소 (German Institute of Polish Culture, 2015년) 및 프랑스 정부 (2015년)의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다. 그의 연구는 독일 외교정책 및 개발도상국의 국제정치경제학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국내외 참고자료
- Rafał Ulatowski, Germany in the Indo-Pacific region: strengthening the liberal order and regional security, International Affairs, Volume 98, Issue 2, March 2022, Pages 383–402.
- Mathieu Duchâtel and Garima Mohan, Franco-German divergences in the Indo-Pacific: the risk of strategic dilution, Institut Montaigne, 30 Oct. 2020.
- Frédéric Grare, Germany’s new approach to the Indo-Pacific, Internationale Politik Quarterly, 16 Oct. 2020.
- 알림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 카카오톡 채널과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 KIMS Periscope는 기획 원고로 발행되어 자유기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